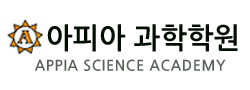‘감’으로 뽑는 영재학급… 합격생도 “왜 뽑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23 00:00
조회1,68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감’으로 뽑는 영재학급…
합격생도 “왜 뽑혔지?”
■ 선발기준 주먹구구… ‘관찰추천’ 싸고 학부모 민원 폭주

‘대체 기준이 뭐지. 아이 친구는 아버지가 공대 교수라서 뽑혔나.
입시 전쟁에서 내 아이가 이미 한발 뒤처진 건 아닐까.
전형이 다시 시작됐는데.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내일 선생님부터 찾아봬야지.’(초등학생 학부모 장모 씨·39·여)
‘처음엔 의욕이 넘쳤다. 자료를 얻으러 영재교육원도 다녀왔다.
열정? 1년도 되지 않아 사그라졌다. 다른 교사들은 남의 일이라는
눈치. 영재 학습 시키면 학부모들은 왜 이상한 것 하느냐고 눈치.
그냥 학습지 풀라고 시킨다.’(서울 A중 과학영재부장 김모 씨)
분야별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영재교육.
서울시내 초중고교가 이런 교육을 받을 학생을 뽑기 위해 영재학급
선발 요강을 대부분 지난달 발표하고 대상자를 심사하는 중이다.
그런데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럴까.
○ 선발 기준이 모호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3가지. 2002년부터 영재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나 지역이 설치하는 영재학급 △영재학교(서울과학고 등 전국 4곳) △지역교육청이나 대학이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이 생겼다.
대상자는 정부가 2007년 12월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증했다. 특히 영재학급은 2008년 994개에서 2011년 3521개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영재학급 학생 선발 기준은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학교
자율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시험을 볼지,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줄지를 학교마다 다르게 정한다. 일부 학교는 방학 과제를 전형에
넣는다. 교사의 ‘감’에 의존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생긴다.
기준 없는 시험에 불안한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건넨다.
중학교 딸을 둔 학부모 김윤미 씨(43)는 “반 학생 절반이 영재교육을 원할 만큼 경쟁률이 높다. ‘영재학급 합격 정찰가’가 얼마라는
소문까지 돈다”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유모 씨(41·여)는 이렇게 고백했다. “담임교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휴가라도
다녀오란 말과 함께 흰 봉투를 건넸어요.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마음이 놓였죠.”
취재팀이 서울 강남구의 3개 초등학교 영재학급에 자녀가 다니는
어머니 30명을 만나 물었더니 선발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60% 정도였다. 서울 송파구 A고 교사는 “선발이 끝날 때쯤 학부모에게서 민원이 쏟아진다. 한동안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영재교육 선발이 ‘관찰추천제’로 바뀌면서 공정성
논란이 더 커졌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집중 관찰해 추천하는 방식.
지필고사를 잘 보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부작용이 늘어나자
교육 당국이 마련한 고육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영재학급을 운영한 학교의 수시 합격률이 높아졌다고 소문나면 다른 학교가 너도나도 영재학급 운영을 신청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찰추천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지도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A수학전문학원
원장은 “영재성 검사에 경시대회, 내신 등 선발 방식이 다양해지니
수강생이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 기관은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 운영 방식은 허술
운영 과정 역시 고칠 점이 많다.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영재교육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한다.
테스트 비용으로 3만 원가량 지불하면 학부모가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재학급은 다르다. 학부모가 부담한다. 비용은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 1년에 30만 원 이상은 기본이다. 100만 원 넘는 곳도 있다.
취재팀이 물어본 결과, 1년에 150만 원 이상 쓴다는 학부모가 7명(23.3%)이나 됐다.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은 5명.
교사 수준과 교육 커리큘럼도 문제. 방과후에 운영되는 영재학급을
지도해도 교사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서울의 A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서로 미루다 결국 투표로 담당 교사를 뽑았다. 서울 B초등학교 교장은 “보통 경험이 부족한 초임 교사에게 떠넘기듯 맡기는 학교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러니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정규 수업보다 약간 심화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교내 우월반을 만든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진다.
또 영재 영역은 10개가 넘지만 수학, 과학, 수·과학 통합 같은 3개 분야에만 80% 이상이 몰린다. 초등학생 부모 C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영어 신동으로 불렸죠. 지금요? 당연히 과학 영재학급에
가야죠. ‘감’ 떨어지지 않게 과학 공부해야 과학고에 가고,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거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A 연구위원은 “영재교육이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영재학교의 순으로 사실상 서열화됐다. 영재학급 경력이 영재교육원에 가거나 고교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으로 활용되니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체 기준이 뭐지. 아이 친구는 아버지가 공대 교수라서 뽑혔나.
입시 전쟁에서 내 아이가 이미 한발 뒤처진 건 아닐까.
전형이 다시 시작됐는데.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내일 선생님부터 찾아봬야지.’(초등학생 학부모 장모 씨·39·여)
‘처음엔 의욕이 넘쳤다. 자료를 얻으러 영재교육원도 다녀왔다.
열정? 1년도 되지 않아 사그라졌다. 다른 교사들은 남의 일이라는
눈치. 영재 학습 시키면 학부모들은 왜 이상한 것 하느냐고 눈치.
그냥 학습지 풀라고 시킨다.’(서울 A중 과학영재부장 김모 씨)
분야별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영재교육.
서울시내 초중고교가 이런 교육을 받을 학생을 뽑기 위해 영재학급
선발 요강을 대부분 지난달 발표하고 대상자를 심사하는 중이다.
그런데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럴까.
○ 선발 기준이 모호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3가지. 2002년부터 영재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나 지역이 설치하는 영재학급 △영재학교(서울과학고 등 전국 4곳) △지역교육청이나 대학이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이 생겼다.
대상자는 정부가 2007년 12월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증했다. 특히 영재학급은 2008년 994개에서 2011년 3521개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영재학급 학생 선발 기준은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학교
자율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시험을 볼지,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줄지를 학교마다 다르게 정한다. 일부 학교는 방학 과제를 전형에
넣는다. 교사의 ‘감’에 의존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생긴다.
기준 없는 시험에 불안한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건넨다.
중학교 딸을 둔 학부모 김윤미 씨(43)는 “반 학생 절반이 영재교육을 원할 만큼 경쟁률이 높다. ‘영재학급 합격 정찰가’가 얼마라는
소문까지 돈다”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유모 씨(41·여)는 이렇게 고백했다. “담임교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휴가라도
다녀오란 말과 함께 흰 봉투를 건넸어요.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마음이 놓였죠.”
취재팀이 서울 강남구의 3개 초등학교 영재학급에 자녀가 다니는
어머니 30명을 만나 물었더니 선발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60% 정도였다. 서울 송파구 A고 교사는 “선발이 끝날 때쯤 학부모에게서 민원이 쏟아진다. 한동안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영재교육 선발이 ‘관찰추천제’로 바뀌면서 공정성
논란이 더 커졌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집중 관찰해 추천하는 방식.
지필고사를 잘 보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부작용이 늘어나자
교육 당국이 마련한 고육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영재학급을 운영한 학교의 수시 합격률이 높아졌다고 소문나면 다른 학교가 너도나도 영재학급 운영을 신청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찰추천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지도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A수학전문학원
원장은 “영재성 검사에 경시대회, 내신 등 선발 방식이 다양해지니
수강생이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 기관은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 운영 방식은 허술
운영 과정 역시 고칠 점이 많다.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영재교육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한다.
테스트 비용으로 3만 원가량 지불하면 학부모가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재학급은 다르다. 학부모가 부담한다. 비용은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 1년에 30만 원 이상은 기본이다. 100만 원 넘는 곳도 있다.
취재팀이 물어본 결과, 1년에 150만 원 이상 쓴다는 학부모가 7명(23.3%)이나 됐다.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은 5명.
교사 수준과 교육 커리큘럼도 문제. 방과후에 운영되는 영재학급을
지도해도 교사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서울의 A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서로 미루다 결국 투표로 담당 교사를 뽑았다. 서울 B초등학교 교장은 “보통 경험이 부족한 초임 교사에게 떠넘기듯 맡기는 학교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러니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정규 수업보다 약간 심화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교내 우월반을 만든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진다.
또 영재 영역은 10개가 넘지만 수학, 과학, 수·과학 통합 같은 3개 분야에만 80% 이상이 몰린다. 초등학생 부모 C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영어 신동으로 불렸죠. 지금요? 당연히 과학 영재학급에
가야죠. ‘감’ 떨어지지 않게 과학 공부해야 과학고에 가고,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거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A 연구위원은 “영재교육이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영재학교의 순으로 사실상 서열화됐다. 영재학급 경력이 영재교육원에 가거나 고교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으로 활용되니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